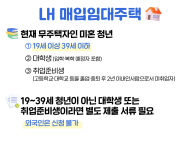홈
문화예술
직업과 일터
홈
문화예술
직업과 일터
상공 150m 한평 남짓, 그녀가 차별 피해 올라간 곳 [타워크레인 조종사]

|
차별을 피해 도착한 곳은 상공 1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조종실이었다. 한 평 미만의 좁은 공간, 소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고공에서 여성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. 28년째 현역으로 건설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타워크레인 조종사 이야기다. 크레인 위 조종실은 외롭고 위태로운 공간이다. 높이는 상공 60m, 높게는 150m에 이른다. 박 씨는 땅 밑의 동료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이곳에 홀로 앉아 기기를 조작해야 한다.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낸다.
1평도 안 되는 좁은 조종실에선 생리현상조차 사치다. 간식은커녕 물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. 여성 조종사는 더욱 그렇다. 오로지 집중, 자그마한 실수도 저 아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. 그나마 돌풍이라도 불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. 그런데 40년 넘게 노동자로 살아온 박 씨는,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비율 5% 미만의 이 좁고 높고 외로운 조종실에 앉고 나서야 비로소 "차별 당하지 않는 일터를 찾았다"고 말한다. "차별이 없는 곳을 찾다보니까 타워크레인을 하게 됐다."
대체가 힘든 고립된 전문직, 조종사가 가지는 일터 내의 특수한 지위가 도움이 됐다. 박 씨는 "거칠고 남성중심적인 건설현장에서 여성들은 더 얕보이거나 간섭에 시달리는 게 사실"이라며 "헌데 크레인 조종사는 혼자 일하기도 하고, 워낙 심적인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"고 설명했다.
노동자도 여성도 '예우' 받지 못하던 사회에서, 여성노동자 박 씨에겐 이 예우가 일종의 안식처였다. 80년대 처음 일터로 나와 방직공장을 다니던 시절에도, 주유소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시절에도 남녀 임금차별은 박 씨의 일상이었다. 그 차별을 피해 버스기사로 취직했지만, 회사의 부조리에 할 말을 하니 회사는 "만만한 여성부터 잘라버렸다." 그렇게 차별을 피해 조종실에 도착한 게 28년 전, 1995년이다.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하늘 위에 마련한 자신만의 일터에도 여전히 불평등은 진득하게 들러붙어 있었다. 박 씨는 일을 시작한 처음 10년의 세월을 "도무지 사람 구실도 못하는 시간"이었다고 회상한다.
성별을 떠난 노동의 문제였다. 비용절감의 굴레 속에서 기업은 조종사들에게 한 평의 여유도 허락지 않았다. 꼬박 20시간을 하늘 위 닭장 속에서 보낸 적도 있지만, 그에 대한 임금은 "형편없이 후려쳐"지곤 했다. 동시에 성별의 문제이기도 했다. 항상, 기업의 비용절감 기조는 같은 노동자 중에서도 소수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왔다. 노동자 중에서도 "한줌밖에 안 되는" 여성노동자들을 위해선 그 어떤 기업도 돈을 쓰려하지 않았다.
"조종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화장실 문제만 해도 신체 구조상 여성들은 더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"라며 "결국 누군가는 커튼을 치고, 누군가는 병이 될 때까지 참고, 누군가는 물 자체를 먹지 않는다"고 설명했다.